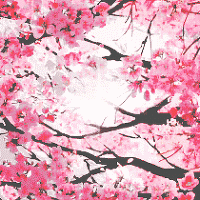반응형
[우리 한시 삼백수] 상상하며 즐기기, 둘
달빛과 산빛 -최항<절구>-
뜨락 가득 달빛은 연기 없는 등불이요
자리 드는 산빛은 청치 않은 손님일세.
솔바람 가락은 악보 밖을 연주하니
보배로이 여길 뿐 남에겐 못 전하리
![]()
뜨락에 달빛이 흥건하다. 대낮 같다. 자리를 깔고 앉으니, 청한 일 없는 청산이 슬그머니
엉덩이를 걸치며 자리를 든다.
겅중겅중 솔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면서 악보로는 잡을 수 없는 가락을 들려준다.
산속의 호젓한 삶이지만 이런 뜻밖의 기쁨이 있다.
이 보배로운 기쁨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나는 아직 그 방법을 모르겠다.
말해주어 봤자 그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테니 말이다.
이 시는 최충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최항으로 바로 잡는다.
출처 : 우리 한시 삼백수 / 정민 평역 / 김영사 / p16,17
![]() <나만의 느낌>
<나만의 느낌>
뜨락 한가운데에 쏟아지는 달빛은 환한 등불과도 같아
저멀리 보이는 희미한 산빛 조차 뜨락 안으로 슬며시 내려앉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지나는 바람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맑은 자연의 소리입니다.
뜨락의 풍경과 자연의 소리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늑해집니다.
이 순간의 행복을 아는 이 또 있을까?
말로 다 하지 못할 이 기쁨,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어디쯤 있을까?
반응형